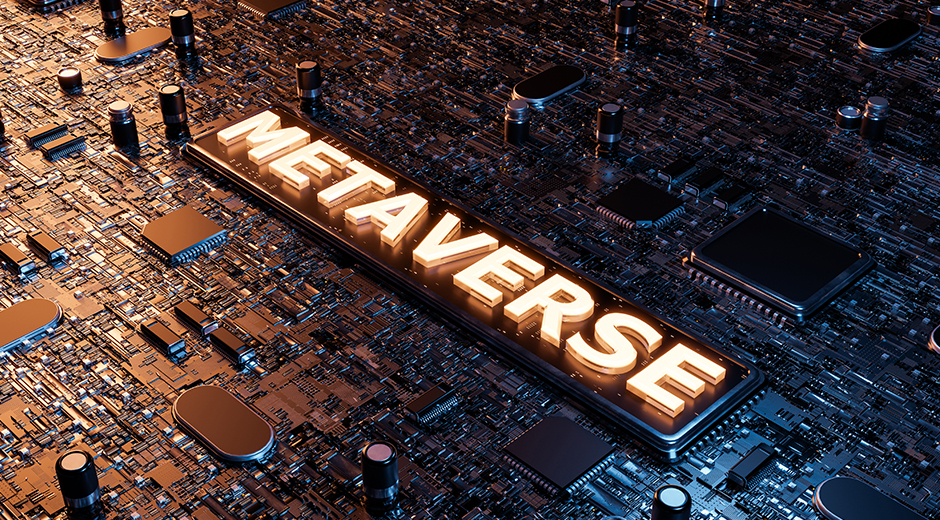지난 1981년 TV 토론회에 나온 스티브 잡스는 “컴퓨터의 미래가 인류의 미래”라고 선언했다. 그는 컴퓨터를 “인간의 특정 지적 능력을 증폭시키는 도구이자, 지루한 일에서 벗어나 인간이 좀 더 잘할 수 있고 창의적인 일을 하도록 도와줄 도구”라고 정의하고, “지금 컴퓨터를 배우며 성장하는 아이들은 실제로 창의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그걸 보면 컴퓨터가 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모든 사람이 컴퓨터를 다룰 수 있다면 정부나 기업의 오용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그 후 40년이 지났다. 컴퓨터는 인간의 창의력을 성장시켰을까? 우리는 지루한 일에서 벗어나 새롭고 흥미로운 일을 골라 하고 있을까?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은 당시 보급되던 개인용 컴퓨터 애플2+(CPU 속도 1MHz)보다 1,000배에서 2,000배 빠른 프로세서를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특정 지적 능력은 더 나아졌을까? 아니 그 전에, 그때보다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영화 <아메리칸 셰프> 포스터(사진 제공: 누리픽쳐스)
영화 ‘아메리칸 셰프(원제: CHEF)’도 맛있는 음식과 함께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진다. 당신은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냐고. 혹시 사람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생각하는, 무례한 짓을 하고 있진 않으냐고. 당신이 인터넷으로 하는 험담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는 건 아느냐고.
SNS에서 시작된 비극, 평범한 셰프의 인생이 바뀌다
아메리칸 셰프는 2014년 개봉한 음식, 여행, 가족, 코미디 영화다. ‘엘프’, ‘아이언맨’, ‘아이언맨 2’, ‘정글북’, ‘라이온 킹’ 등을 감독한 존 패브로(Jon Favreau)가 감독이자 주연(칼 캐스퍼 역)을 맡았다.
덕분에 제작비 1,100만 달러의 저예산 영화인데도 조연이 아주 호화롭다. 더스틴 호프만(리바 역), 스칼렛 요한슨(몰리 역)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마빈 역, 우정 출연), 소피아 베르가라(이네즈 역)까지, 여기저기 익숙한 얼굴이 스쳐 지나간다.
이런 호화 멤버가 일하는 레스토랑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다. 오랫동안 지역에서 인정받은 식당이다. 주인공 칼은 이 레스토랑 셰프다. 실력이 좋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게 평판도 좋다. 이혼했지만 나름 아들과도 함께하려고 한다.
나름 나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찾아온 유명 요리 평론가이자 블로거 램지 미첼(올리버 플랫 분) 때문에 열 받는 사건이 발생한다. 애써 만든 음식에 별 두 개의 리뷰를 주면서 비난한 것. 그가 쓴 글은 그의 트위터에도 올라갔고, 그 글은 램지 미첼의 수많은 팔로워에게 공유되면서 칼에게 망신을 줬다.

▲영화 <아메리칸 셰프> 스틸 컷(사진 제공: 누리픽쳐스)
여기에서 끝났으면 그나마 나았을 것이다. 트위터를 모르던 칼은 이 사건으로 트위터 계정을 만들고, 램지 미첼에게 통한의 막말을 날린다. 트위터를 처음 사용한 그는 그 메시지가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다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서로 막말을 주고받다가 칼이 재대결을 신청하지만, 레스토랑 오너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오히려 직장에서 해고당하게 된다. 안 그래도 화가 났는데, 재대결 날 레스토랑을 다시 방문한 미첼이 비웃는 트윗을 올리자 아예 폭발한다. 레스토랑에 쳐들어가 그와 큰 소리로 말다툼하게 되고, 그 말다툼 영상이 SNS에 다시 올라가며 인터넷 스타로 거듭난다.
누군가가 몰래 찍어 재미있다고 올린 영상 때문에, 칼의 인생과 커리어는 한 방에 날아갔다. 이 사건을 보고 칼이 도움을 청한 SNS 홍보 담당자가 “이제 남은 길은 ‘헬스 키친’처럼 화난 셰프가 등장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거나 가만히 숨어서 사건이 잠잠해지길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할 정도다. 자리를 알아본 다른 레스토랑에선 연락이 하나도 오지 않는다. 인터넷에는 칼의 영상이 돌아다니고 신문 기사가 돼 팔린다. 적당히 좋고 적당히 나빴던 인생이 갑자기 롤러코스터를 타게 됐다.
인터넷이 바꿔 놓은 세상… 무례함이 당연해지다

▲영화 <아메리칸 셰프> 예고편 캡처(사진 제공: 누리픽쳐스)
“당신은 내 자존심을 빼앗았고, 내 경력과 존엄성을 빼앗아 갔어요. 당신 같은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겠지만, 그래도 당신은 알아야 해요. 그러는 건 우리한테는 상처예요. 우린 노력한다고요.”
– 영화 ‘아메리칸 셰프’에서 주인공 칼 캐스퍼가 평론가 램지 미첼과 다시 만났을 때 한 말 中
인터넷은 어떤 곳일까? 보통 쌍방향성, 개방성, 익명성을 가진 곳이라고 정의된다. 이런 특징은 전에는 묻혀 있었을, 많은 작은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인터넷은 가장 참여적인 시장이고, 표현 촉진적인 매체”라고 말했다.1)
1) 헌법재판소 2002. 6. 27.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인터넷은 우리의 삶을 편하게도 만들어준다. 우린 스마트폰으로 인터넷과 연결해 물건을 사거나 금융 거래를 하고, 친구와 소통하며, 영화, 게임, 음악 등을 즐기는 세상에서 살아간다. 코로나19 시대에 인터넷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과연 버틸 수 있었을까?
반면 인터넷 공간에서는 인간의 악한 마음도 그대로 드러난다. 이미 수많은 사람이 상처받았다. 이럴 줄 몰랐던 것도 아니다. 사이버 폭력은 인터넷 통신 초창기부터 문제가 됐다. 1981년의 잡스도 이런 문제를 짐작했을 것이다. 다만 모두가 컴퓨터를 다룰 줄 알게 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직접 대면하지 않는 인터넷 공간에서, 인간이 얼마나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간과했다. 시간이 지나니 사이버불링(Cyberbulling, 인터넷 공간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이나 악성 댓글 같은 일이 점점 평범해지고 있다. 때론 우쭐해져서 별생각 없이 하면 안 될 얘기를 적기도 한다. 오죽하면 영화 속 요리 평론가가 당당하게 “나야 원래 독설이 직업인데, 그게 뭐라고 싸움을 거느냐”고 말할까 싶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심리학자 에린 버클스는 인터넷에서 악의적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크게 △사이코패스 △권모술수 △자기애 △가학증 등 4가지 성향이 있다고 본다. 이들에겐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은 놀이다. 본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저 남에게 고통을 줘서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고, 그런 가학적인 재미를 위해 노는 것일 뿐이다.2)
2) 출처: Trolls just want to have fun, rin E. Buckels 외 2인, 2014
무례함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는?
여기서 잠깐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소개하면, 이 영화는 존 패브로 감독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싶어서 찍은 영화다. 영화를 찍고 나서 미국 경제지 ‘패스트 컴퍼니(Fast Company)’와 한 인터뷰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인터뷰에 따르면 큰 시스템의 부품처럼 영화를 찍다가 질린 감독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손댈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어 이 영화를 만들었다. 요리사 이야기를 하게 된 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건 너무 재미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영화 <아메리칸 셰프> 스틸 컷(사진 제공: 누리픽쳐스)
각본가로서 영화 스토리 안에는 한 남자가 아빠가 되고, 이혼하고, (현실과) 갈등하는 이야기와 영화판에서 살아온 20년을 돌아보는 이야기를 담고 싶었다고 한다. 그런 영화의 갈등이 트위터 어뷰징(Abusing, 의도적으로 클릭 수를 늘리는 행위)으로 시작됐다는 건, 우리 시대의 주요 갈등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다만 이 이야기가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건, 주인공 칼이 그토록 화났음에도 불구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벼운 막말을 날리긴 했지만, “이 음식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만든 건지 네가 알기나 하냐?” 정도였다. 계속해서 평론가를 비방하거나 괴롭히지도 않았고, 드러내 놓고 그를 미워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
만약 그가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면, 그건 재미있는 영상이 아니라 혐오스러운 영상이 됐을 것이다. 혐오스러운 말을 내뱉은 사람이라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트위터에 푸드트럭을 홍보했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몰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선을 넘은 무례함은 관계를 파괴한다. 파괴의 대가는 모두 함께 감당해야 한다. 분쟁을 일으키는 특정 회원 때문에 망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본 적 있을 것이다. 진실이 아니라 선동, 분란을 조장하는 악플러도 자주 경험했을 것이다. 실제로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성인 10명 중 4명 이상이 온라인에서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온라인상의 무례함은 일터에서도 영향을 끼친다. 일례로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임을 만드는 A사는 해당 게임에서 직원들이 채팅한 기록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그 결과 게임에서 드러내는 유해성과 직장에서 보이는 나쁜 언행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전년에 해고된 직원의 25%가 비정상적으로 게임 내 독성이 높은 사람이었던 것. 그들이 주로 했던 행동은 비꼬는 말이나 폭언이었고, 때론 타인을 위협하기 위해 직원의 권한을 남용하기도 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가장 무례하다 판단된 직원 30명에게 그 사실을 알려줬더니 퇴사를 선택했던 몇 명을 제외하곤 “행동을 고치겠다, 사려 깊은 게이머는 물론 더 나은 사람(Better People)이 되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이다.3)
3) 출처: Riot Games: Assessing toxicity in the workplace https://rework.withgoogle.com/case-studies/riot-games-assessing-toxicity/

사실 이처럼 무례한 사람이 많지는 않다. 수는 적은데, 왕성한 활동력으로 세상을 어둡게 만들 뿐이다. 미국 코넬 대학 연구팀이 미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커뮤니티 ‘레딧(Reddit)’에서 40개월간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커뮤니티 간 분쟁 발생 구조를 조사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의 사용자가 전체 분쟁의 74%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4)
4) 출처: Community Interaction and Conflict on the Web, Srijan Kumar 외 3인, 2018)
또한 지난해 중앙일보에서 분석한 기사를 보면, 네이버 뉴스에서 왕성하게 댓글을 다는 소위 ‘헤비 댓글러’는 전체 작성자의 0.1%인 123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들은 36만 개 댓글 중 무려 16.6%를 작성했다. 댓글을 다는 사람이 전체의 10%도 안 된다는 걸 생각하면 포털사이트에서 연예, 스포츠 뉴스 댓글을 폐지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셈이다.5)
5) 출처: [팩플] 네이버 ‘헤비 댓글러’ 123명…이 0.1%가 여론 흔든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45361
결국, 상냥함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앞서 스티브 잡스는 이런 문제를 생각했을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솔직히 많은 이는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1990년대 인터넷 도입 초기만 해도 우리가 생각했던 문제는 인터넷 공간을 정부가 검열하거나 특정 회사가 독점할 수 있다는 정도였다. 다른 것이 있다면 사람들이 인터넷에 빠져 방 바깥으로 나올 생각을 하지 않거나, 개성이 사라지고 집단주의에 빠져들 것이라는 걱정 수준이었다. 현실과 사이버 공간을 분리해 놓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반도체 기술이 지금보다 부족했던 세상에선 기술 발전에 신경을 쓰기에도 모자라서, 발전된 기술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생각하는 것은 뒤로 미루기 바빴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인터넷을 쓰지 말자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세상은 변했고, 변한 세상에 어떻게든 적응해서 살아가야 한다. 영화도 마찬가지다. 사건의 시작은 SNS였지만, 해결책도 SNS에 있었다. 칼이 중고로 사들인 푸드트럭을 고쳤을 때, 그는 옛날식 홍보만 생각했다. 트럭을 세우고 확성기를 통해 주변 사람을 모으는 것이었다.

▲영화 <아메리칸 셰프> 스틸 컷(사진 제공: 누리픽쳐스)
하지만, 아빠와 함께한 아들 퍼시(엠제이 안소니 분)는 신세대답게 트위터를 활용해 고객을 모으기 시작한다. 아들은 무례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웃겼던 아빠의 동영상이 그를 유명한 셰프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아쉽게도 현실은 영화와는 다르다. 많은 SNS는 어뷰징으로 인해 망가졌고, 이들 서비스 대표는 때때로 국회 같은 곳에 나가 증언해야 할 처지가 됐다. 무례한 글을 덜 쓰게 시스템을 개편해야 하는데 그건 돈벌이에 안 좋으니 내버려 두거나 오히려 그런 글을 더 쓰게 장려한 탓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큰 시스템을 쉽게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영화 속 칼이 보여준 것처럼, 무례하지 않게 살기를 택할 수 있다. 막말을 해야 돈을 버는 세상이어도, 스스로 거기에 묻어갈 필요는 없다.
현실과 가상에서 서로 다른 사람으로 살 수는 없다. 우리 태도는 결국 언젠가는 드러난다.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막말을 하지 않아야,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 남을 비방하지 말아야,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지켜야, 먼저 정중해야, 무례한 사람에게 대처할 힘이 생긴다. 무례하게 굴었던 사람을 도와줄 사람은 없다. 아마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 중에 무례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 본 칼럼은 반도체/ICT에 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외부 전문가 칼럼으로, SK하이닉스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